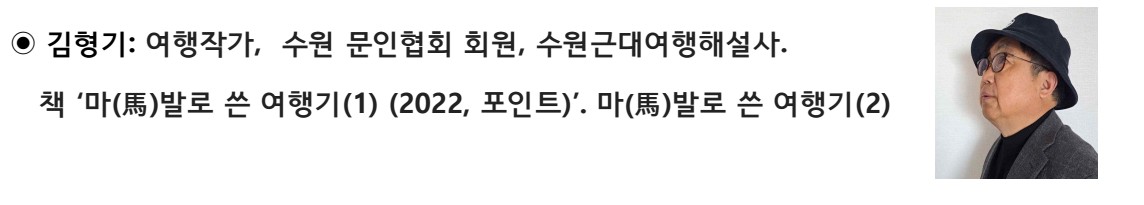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의 홍범식 선생 생가에 왔다. 이 집에서는 금산군수로 재직하다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에 항거하여 순국한 홍범식 선생이 성장했던 곳이다. 1919년 3·1운동 당시 지역 주민들이 이 집에서 모여 괴산(槐山) 만세운동을 준비하였다고 전한다. 이 고가는 벽초 홍명희(1888∼1968)의 생가이기도 하다. 홍명희 선생이 이곳에서 소설 임꺽정을 집필했다고 한다.

고택(故宅)을 돌아보았다. 이 가옥은 조선 후기 중부지방 양반가의 특징을 보여주는 고가(古家)인 동시에 3·1운동과 관련된 유적이며, 문학사적 유산이자 항일지사의 고택인 귀중한 자료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 정남향으로 지어진 건물의 안채 구조는 □자 형으로 되어있다, 전체적으로 뒷산의 자연경관을 집안으로 끌어들여 조화시키며 아름다운 내부공간이 되었다. 좌우대칭의 평면구조의 가옥은 전형적인 중부지방의 건축양식이다.


고택에서 만난 해설사가 이 고택에 얽힌 가족사를 알려주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이 국권을 빼앗기자, 홍범식 선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결하였다. 선생은 아들에게 죽을지언정 친일하지 말고 먼 훗날에라도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이를 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버지의 유훈을 받은 홍명희는 고향 괴산에서 3·1운동을 주도하였고, 독립운동에 투신해 끝내 변절하지 않았다.

홍범식 선생의 아버지 홍승목은 일제에 나라를 바친 친일파였다. 그의 아들 홍범식 선생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기자 자결한 애국지사였으며, 그의 손자인 벽초 홍명희 선생은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해방 이후 북한으로 넘어가 내각 부수상이 되어 한국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지난(至難)한 역사가 착잡(錯雜)하다.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으로 잘 만들어진 고가(古家) 앞으로 괴강(槐江)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 홍승목(洪承穆, 1847-1925)은 조선 말기의 관료로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후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로 재직하였으며,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 받았다. 일제강점기 초기의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홍범식(洪範植, 1871-1910)은 충청북도 괴산 출생의 조선 말기의 관료이다.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 조약의 체결 소식을 금산군수로 근무하면서 듣게 되었고, 순종이 조약 체결을 공포하자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어 자결하였다.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홍명희(洪命憙, 1888-1968)는 괴산 출신으로 호는 벽초(碧初)이다. 평생 소설창작, 언론활동, 정치활동, 독립운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이광수, 최남선과 더불어 조선의 3대 천재로 대표되었던 인물이었으며, 소설 ‘임꺽정’의 작가로 유명하다. 해방 후, 1948년에 월북하여 북한의 내각 부수상 등 정치인으로도 활동하였다.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소설 임꺽정은 1928년부터 1939년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미완의 소설이다. 임꺽정은 글을 깨우친 뒤 입산하여 뛰어난 검객이 되었다,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으로 사람들은 청석골로 모여들어 화적떼를 이루고 임꺽정을 대장으로 추대하였다. 화적떼가 못된 관리들을 물리치는 사건이 잇따르자 조정에서는 이를 소탕하려 한다. 이에 위기를 느낀 화적떼가 청석골을 떠난다는 이야기이다. (고택의 브로셔에서)